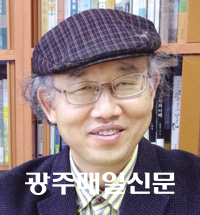더불어 사는 광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광주매일신문] 입력날짜 : 2018. 01.28. 18:42
|
해가 바뀌고 한 달이 되었다. 설을 앞두고 있지만, 연간 계획은 흔히 양력으로 짜기에 각 분야에서 2018년을 어떻게 설계하는 지를 살펴볼만하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17132532428971028
최근 광주광역시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시민 행복을 위해 ‘10대 복지건강 시책’을 발표했다. 10대 시책은 광주형 기초보장제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제 의료 교류·협력 강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광주노인회관 신축, 근육장애인 맞춤형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영락공원 인근 지역 생활불편 해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등이다.
광주시는 전체 예산 4조5,138억원의 37%를 복지에 투자한다.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대한노인회의 바람이 반영된 광주노인회관 신축 등은 이루어질 것이다. 광주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10대 시책’을 넘어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광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세금으로 하는 복지를 넘어 시민이 사회보험과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2018년부터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뀌었다. 1910년 8월 말에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그해 10월에 면사무소를 만들어 주민을 감시하고 재산변동을 파악했다.
이후 면사무소의 핵심 기능이 조금씩 바뀌었고, 2018년을 계기로 행정과 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시민이 읍·면·동 행복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기에 행복센터는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시민은 행복센터가 이름값을 하도록 관심을 갖고, 행복센터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만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이다.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늘지 않았기에 노후에 보다 건강하고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노인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선택 진료비’를 사실상 폐지하여 환자가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고, 급여 항목도 ‘특진’이란 이름으로 선택 진료를 강요받았다. 선택 진료는 전액 본인부담이기에 환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선택 진료비가 사라졌다.
선택 진료비가 없어져 과거 비싼 병원비를 걱정하여 ‘실비의료보험’에 가입했던 관행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항목은 본인부담비율이 20%에서 5%까지 낮추어지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일정액을 넘으면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굳이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인은 가처분 소득에서 사보험료의 부담이 매우 컸는데, 선택진료비의 폐지와 본인부담금의 개선책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복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보다 촘촘하고 탄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동단위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노인,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광주와 전남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주지만, 서울은 43%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서울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광주시도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편적 복지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welfare@hanmail.net